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 사이에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원칙: 계약직 근무 시작일부터 정규직 퇴직일까지의 전체 근속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이 퇴직금 기산일이 됩니다.
-
이유: 근로계약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계약직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
원칙: 계약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
이유: 계약직 근로 계약이 종료되고 퇴직금이 정산되었으므로, 정규직 입사는 새로운 고용 관계의 시작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고용관계 단절 여부: 고용관계 단절 여부는 단순히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인사 발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관계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후 며칠 쉬었다가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
사례 1: 2022년 1월 1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2024년 1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4년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해 산정됩니다.
-
사례 2: 2022년 1월 1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2024년 1월 1일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하여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2년 근속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회사와 퇴직금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퇴직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노동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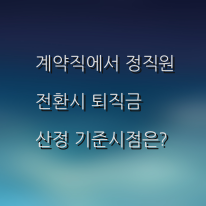
'이게 뭔지 궁금해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당근에서 원룸 월세 계약 방법 (0) | 2025.02.21 |
|---|---|
| 민사재판와 형사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 | 2025.02.20 |
| 계약직 2년 근무하고 바로 동일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계약직 근무 가능한가요? (0) | 2025.02.20 |
| 일반임대사업자 말소 절차 (0) | 2025.02.20 |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0) | 2025.02.20 |